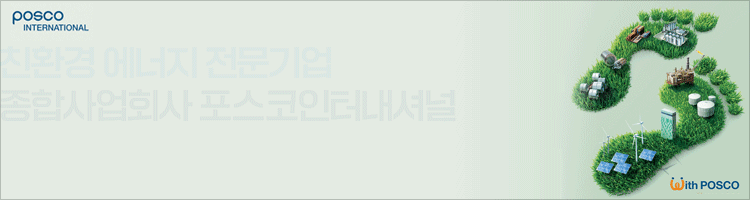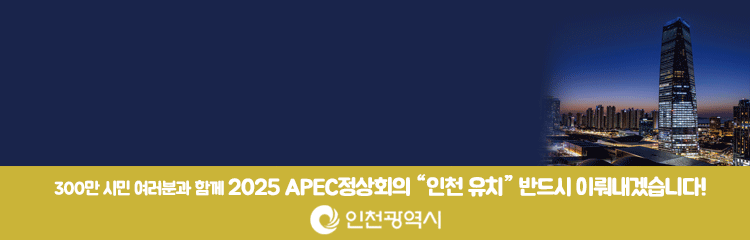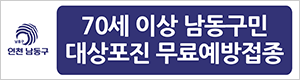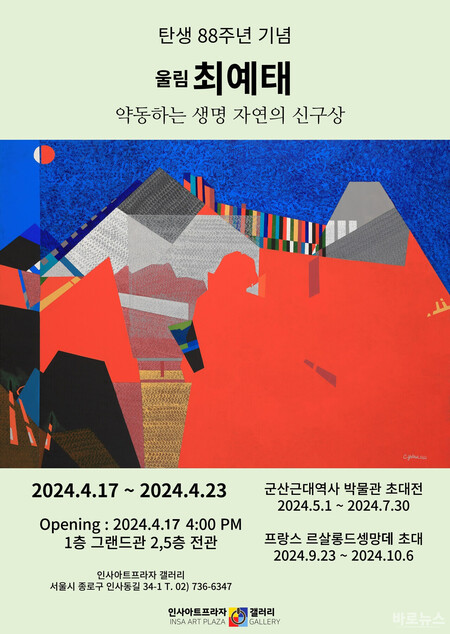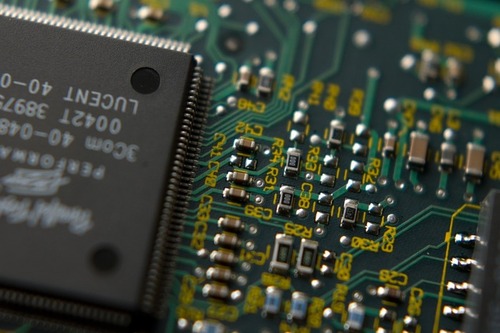[김윤진의 영화리뷰] “언제까지 암울해야만 하는가...” 영화‘기생충’ 시대이분법적 눈으로 본 현실 희망을 찾아라
[김윤진의 영화리뷰] “언제까지 암울해야만 하는가...” 영화‘기생충’ 시대이분법적 눈으로 본 현실 희망을 찾아라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을 보러 갔습니다. 늦은 저녘 우리나라 최초로 ‘2019 칸느영화제 황금종려상’이란 쾌거로 세계 영화인들에게 대한민국의 영화를 널리 알린 영화 ‘기생충’, 방송은 물론 대통령 축사까지 곁들인 기대감을 갖고 상영관에 예매를 했습니다. 영화 시작하기 1시간 전 예매율은 전체 좌석의 30%가 채 되지 않아 어허 500만이니 1000만이니 한다는데....라고 고개를 갸우뚱거린 게 무색하게 느낀건, 막상 상영관에 도착해 보니 좌석마다 관객들이 꽉 찬 만석이었다는 것이다.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수상작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보러 왔으리라 생각되었습니다. 칸느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에 대한 경외심도 한 몫 했을거고,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최우수작인 자국의 영화에 대한 자긍심과 위상을 잧으며, 자국 국민이라면 한 번은 봐야 된다고 생각되는 의무감도 내심 있었습니다. 기대감 반, 흥미 반으로 영화를 보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 안타까움과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우려감이 들었다면 민감함 반응이었을까 제목에서 느껴지는 느릿느릿 스물거리며 숙주에 착취해 생활하는 ‘기생충’이 현실에 대한 자각을 일깨워주는 불편함이 먼저 느껴져서였습니다. ‘기생충’ 영화는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수상을 받은 영화를 보는 즐거움이 있지만, 삶의 희망과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대보다 현실자각을 일깨워주는 영화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심한 듯 펼쳐지는 세 가족의 이야기, 반지하에 살며 생활을 해가는 기택네 가족과 상류층의 박사장네 가족, 그리고 가족이 안 보이는 반쪽짜리 가족인 가정부가족, 그들은 모두 무심한 듯 그저 일상을 살아갔다. 체제의 침범이 없었을 때는..... 반지하 기택네 가족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일궈나가는 삶의 모습이 아닌 친구의 추천으로 상류층 가족의 딸의 가정교사가 된 아들은 차례차례로 자신의 가족과 상류층인 박사장네 가족의 고용인들을 대체해 나갑니다. 감언이설과 모략과 계략으로 기존의 고용인들을 몰아내고 지하 기택네 가족 전체는 상류층 가족의 고용인으로 채용된다. 가족 전체가 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추천한 친구가 우려하면서 부탁했던 딸과도 사귑니다. 도의와 우정도 저 버린채로, 영화는 전혀 현실적이지 않는 상류층 박사장네 가족의 가정부에게서 또 다른 유형의 기생충같은 단면을 보여줍니다. 사업에 실패한 자신의 남편을 4년이 넘게 지하실에서 은밀하게 은폐한 생활을 돕는 소름끼치는 행위에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박사장네 가족들이 아들 생일 축하파티로 캠핑을 가서 집안에 없는 그폭우가 쏟아지는 날 그들은 대면하게 되고 그들끼리의 치열한 각투로 생존혈투를 벌입니다. 여기서부터입니다. 영화에서 불쾌감이 느껴지며 맘이 편하지 않았던 것은. 아무런 일상의 변화를 감지 못하는 상류층 가족의 평온함에 자괴감을 느끼게 됐고, 치열한 각투를 벌이는 두 가족의 비열함을 넘어 뻔뻔함은 불쾌감을 넘어 가슴에 묵직한 돌덩이가 얹혀져 있는 것같은 불편함이 느껴져 영화보는 내내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뜬금없이 등장한 애정 씬에선 상황을 보지 않고 쾌락을 추구하는 이기심까지 등장하고, 천둥번개가 치는 폭우가 쏟아지는 밤, 정원에 난대없이 미제캠프를 치고 밤을 새우고 있는 어린 아들을 만류하지도 못하고 거실에서 지켜보는 부모가 탁자아래 기택의 가족이 있는데 거리낌없이 욕정이 밀려와 애정을 나누는 장면 아메리카를 개척한 영국인들은 인디언들을 노예로 삼았는데 그들은 인디언을 동물과도 같은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거리낌없이 성관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인디언 이야기가 나오고 영화의 막바지 부분에서 기택이 인디언 모자를 쓰는 것을 보면 혹 박 사장네는 기택의 가족들을 사람취급하지 않는다 것을 암시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성욕을 통해 박 사장 또한 인간임을 표현됐다고 보여지고...관객들은 영화를 보는 내내 흥미와 더불어 안타까움이 아닌 아슬아슬한 스릴과 뭐라고 표현하지 못할 불편함 감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날의 폭우는 반지하 기택네 가족들에겐 물 난리로 이어지고, 물 난리로 이재민이 된 기택네 가족들의 상황과는 관계없이 일상생활은 계약관계에 의해 본인의 기본적인 감정조차 숨기고 박사장네 가족의 아들 생일파티에 초대받은 가족들의 생존권과 결부된 삶에서 자신들 처지에 대한 비하감이 표출됩니다. 언어적 수단이 아닌 아주 미세한 손짓과 표정, 지하방 냄새에 대한 표현, 한 번의 표현은 알아차리는데 시간이 걸리지고 지나칠 수도 있으나 표현의 반복되는 냄새에 대한 표현은 그들도 얼마 되지 않아 알아 차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미 말로서도 언급되었던 그 냄새, 쾌쾌한 결코 상쾌하고 후레쉬한 냄새일 수 없는 그 냄새, 코를 막고 찡그리게 되는 냄새에 대한 반복된 표정이 거듭될수록, 그들은 무언의 존재의 차이를 느끼고 있지 않겠는가 비록 박 사장네 가족에게는 아무 의미없이 한 행동이라 해도.... 하층민끼리는 각투와 생존 혈투로, 선을 넘지 않아야 되는 체제의 선이 있다는 상류층과의 격투도 인권차별에 대한 결과의 끝은 살인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는 주변의 일상은 아무일 없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아무 일이 없습니다. 사건이 일어났던 그 집은 부동산 거래업자에 의해 다시 거래되고, 가족들도 딸과 아버지가 없이 일상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망한 딸과 자취가 사라진 아버지의 부재를 확인하며, 아들은 종종 그 집이 보이는 산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아들은 어느날 깜박이는 거실 등에서 모르스 부호를 발견하고 아버지의 편지를 해석합니다. 계획이 없던 인생에 계획이 생긴 것은 아버지를 구출하겠다는 희망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당장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어 그 집을 꼭 사서 아버지를 지하실에서 나오게 하겠다구 아버지는그냥 걸어 나오시면 된다고 끝을 맺습니다. 바라보는 관객들의 가슴이 답답해지는 상황입니다. 지하방에서 그 집을 사기에는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힘든 현실이란걸 알기 때문입니다. 계획처럼 현실은 이뤄지지 않는다는 아버지의 말처럼. 답답한 현실. 타개되지 않을 듯한 체제의 선. 시원한 희망을 주지 못하는 것도 이러한 현실의 반영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현실은 암울하더라도 미래의 희망과 꿈을 꾸며 건강하게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꿈과 희망은 어두움 속에 빛과 같고, 어두운 상황을 헤쳐가는 희망의 노래와 같습니다. 영화을 통해 봉준호 감독은 보여주고 싶은 것은 현실을 자각해서 체념해 안주하기 보다는 변화된 의지와 행동으로 희망을 갖고 미래를 계획하자는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의 의미를 주고 있는건 아닌가 싶습니다.
김윤진 기자 7225kyj@gmail.com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내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