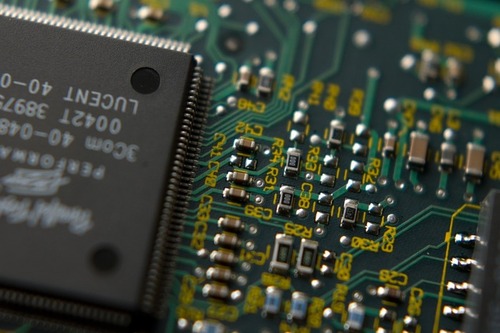[고영화 칼럼] 실학자 홍양호(洪良浩), 인생과 시(詩)를 논하고 군졸들의 고통을 진술하다
명심보감(明心寶鑑)에서 이르길, "하늘은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을 내지 않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기르지 않느니라.(天不生無祿之人 地不生無名之草)"
[고영화 칼럼] 실학자 홍양호(洪良浩), 인생과 시(詩)를 논하고 군졸들의 고통을 진술하다명심보감(明心寶鑑)에서 이르길, "하늘은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을 내지 않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기르지 않느니라.(天不生無祿之人 地不生無名之草)" 우리네 인생이란 살다보면 햇볕이 쨍쨍 내리쬐다가 갑자기 비바람도 치고 태풍도 지나간다. 그러나 그 속에서 의미를 찾고 춤을 추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도스토예프스키는 "나는 나의 고통이 의미 없어질 때가 가장 두렵다."고 말했다. 자기 인생의 의미를 놓아버리는 순간, 내 모든 시련은 감내해야 할 그 어떤 이유도 찾을 수 없는 절대 고통으로 변해 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를 잃지 않아야 한다. 게다가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이란 인간의 본질인 죽음, 외로움, 그리움이 도꼬마리처럼 자꾸 따라붙는 것을 떼어내려고 애쓰는 것이며, 더러는 두렵지 않는 척, 외롭지 않는 척, 아프지 않는 척, 슬프지 않는 척하고 사는 것이다. 명심보감(明心寶鑑)에서 이르길, "하늘은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을 내지 않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기르지 않느니라.(天不生無祿之人 地不生無名之草)" 하였다. 사람의 인생도, 길가의 잡초도 모두 자연과 더불어 환경에 따라 제각기 충실히 살아간다. 또 한편으론 우리네 인생이란 “하루살이 같은 부유일생(?遊一生)이요, 아침이슬 같은 덧없는 초로인생(草露人生)”이니 괜한 걱정 말고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야 한다. ● 다음 소개하는 가요(歌謠) 3편은 조선후기 실학자 홍양호(洪良浩 1724~1802)가 엮은 『천구단곡(靑丘短曲)』에 수록돼 있는 작품이다. 덧없는 백년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홍양호는 <인생 백년(百年)> <인생(人生)> <옛사람(古人)> 3편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자신에게 되묻는 실학자로서의 모습을 보였다. 홍양호의 <백년(百年)>과 <인생(人生)>은 중국 한(漢)나라 《악부고사(樂府古辭)》 서문행(西門行)에 나오는 ‘백 년도 못사는 인생이 늘 천 년 근심을 품고 산다.(人生不滿百 常懷千歲憂)‘라는 구절과, 명심보감(明心寶鑑)에 ’백 살을 사는 사람이 없건만 부질없이 천 년의 계획을 세운다.(人無百歲人 枉作千年計)‘라는 구절을 인용(引用)⋅참고하여 쓴 글이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돌아보면 아무 필요 없는 걱정까지 하면서, 당장 눈앞에 닥쳐오는 근심에도 허둥지둥 동분서주한다. 이것이 인간의 모순이란 것이다. 1) 인생 백년[百年] 가요(歌謠) / 홍양호(洪良浩 1724~1802) 人生縱使百年 사람이 가령 한평생 백년을 산다 해도 百年眞如風中烟 그 백년은 그야말로 바람속의 연기 같은 것, 除却疾病與憂患 질병과 근심 걱정 다 빼고 나면 開口笑語能幾時 크게 웃으며 사는 날이 얼마나 되랴 ?復百年難期 더구나 백년도 살기가 어려운 우리네 인생 今我不樂何爲 지금 우리가 즐겁지 아니하고 어찌하리까. ○ 인생은 무의미하다. 그러나 각자 인생에 의미와 가치를 찾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인생이요, 인간다움이다. 또한 생로병사(生老病死) 희비애환(喜悲哀歡)이 인생의 역정이요, 삶의 내용이다. 백년도 다 살지 못하면서 사람들은 어쩌자고 쓸데없는 일에 마음 쓰면서 괴로워하고 시간을 낭비할까. 왜 즐겁고 행복하게 살지 못할까. 미래 과거 보다 현실에 충실하게 사는 것만이 진정 행복으로 다가가는 일임을 왜 모르는 것일까. 인생 뭐 별거 있나 자신이 주체가 되어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들에 미쳐 살면 된다. 그런고로 ‘무심히 흐르는 구름처럼, 묵묵히 피우는 꽃처럼, 자신의 길을 걸어가자.’ 2) 인생[人生] 가요(歌謠) / 홍양호(洪良浩 1724~1802) 人生不滿百 백년도 못 채우는 인생인데 此身寧有二 이 몸이 어찌 두 마음 가지랴 元是假形來 본디 형체를 빌어 와서 偶然寄在此 우연히 여기로 보내 존재하는 것이니 胡爲漫營營 어떤 이유로 아득바득 살아가랴 所貴惟適意 오직 내 뜻에 맞는 게 중한 것이지. ○ 인생은 무엇보다 자신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게 중요하다. 백년도 채 못사는 짧은 인생인데 무엇 하려고 남의 눈치나 보며 현재의 행복과 자유를 포기한 채 쳇바퀴 같은 삶을 아득바득 살겠는가 “어떤 대상에 감동하고 어떤 일에 몰입하고 그리고 아름다움을 느끼기 위해 우리는 이 땅에 온 것이다.” ‘오직 내 뜻에 맞는 삶’이야말로 자유롭다. 나를 ‘나’ 라는 정체성을 오롯이 지키며 나답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삶을 의미 있고 목적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빼앗기지 않는 영혼의 자유이다. ● 인생은 ‘눈 내린 진흙위의 기러기 발자국’과 같은 것! 설니홍조(雪泥鴻爪)란 “눈 내린 진흙위의 기러기 발자국”이란 뜻이며, 눈 위에 기러기의 발자국이 눈이 녹은 뒤에는 없어진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는 “인생의 자취가 덧없고 삶이 무상함“을 일컫는 말로 사용된다. 중국 송나라 때의 문인인 소동파(蘇東坡)가 그의 동생인 소철(蘇轍)에게 지어 보낸 <면지에서 옛일을 회상하며(和子由沔池懷舊)> 시에 나오는 구절로 다음과 같다.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은 무엇과 같을까 눈 내린 진흙 밭에 남긴 기러기 발자국 같이, 우연히 눈 위에 발자국 남겼다 해도 기러기 어디로 날아갔는지 누가 알랴.(人生到處知何似 應似飛鴻踏雪泥 泥上偶然留指爪 鴻飛那復計東西)” 당(唐)나라 시인 진도(陳陶 812~888)도 <봄이 가네(春歸去)>라는 시에서 인생이 짧고도 허무함을 말했다. 처음 두 행에서 “구십일 화창한 봄 날씨 이제 어디 있느뇨, 옛 사람 지금 사람 모두 머물지 못하네.(九十春光在何處 古人今人留不住)” 진도(陳陶)는 마음이나 의욕은 청년처럼 아직 젊은데, 육체가 쇠잔해진 것을 서러워하며 덧없이 흐르는 세월을 한탄했다. 존재한다는 것은 즉, 나의 의지와는 달리 천지자연(天地自然) 속에 내던져진 우주의 미물로 기생하다가, 무상(無常)하게도 기러기가 날아가 버린 후, 눈 위에 남아 있던 발자국이 녹듯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게 바로 인생이다. 그런고로 자신을 거울에 비쳐보아도 부끄럽지 않은 인생, 그것이 바로 자신을 위해 사는 인생일 것이다. 3) 옛사람[古人] 가요(歌謠) / 홍양호(洪良浩 1724~1802) 古人不待今人 옛사람은 지금 사람을 기다리지 않듯이 今人還思古人 지금 사람도 옛사람을 되레 생각하리까. 古人雖已遠 옛사람은 비록 이미 멀어졌으니 行處又今人 가는 곳마다 모두 지금 사람이다. 莫道今人古人不相及 지금 사람이 옛사람에 서로 미치지 못한다 말하지 말라 聖賢與我均是人 성현(聖賢)과 내가 모두 같은 사람(均是人)이라는 것을. ○ 실학자가 탈성리학의 사유에 대해 언급하며 다른 이민족이 세운 국가와 독특한 풍속에 대해서, ‘모두 같은 사람(均是人)’, ‘모두 같은 군왕(均是君王)’, ‘모두 같은 나라(均是邦國)’, ‘모두 같은 풍속(均是習俗)’이라고 하여 다원성과 독자적 가치를 옹호하였다. 인간을 평등하게 보는 자연적 존재로서의 ‘모두 같은 사람(均是人)’의 관점을 내세운 것이다. 문화적 평등을 제시한 ‘모두 같은 풍속(均是習俗)’ 또한 그러한 인식에서 출발한다. 또한 교육에 따라 성인이 되기도 하고 현인이 되기도 하니 경륜의 식견과 실천적인 학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겼다. 이러한 입장에서 실학은 구체적인 현실 문제를 중심으로, 사회변화를 탄력 있게 수용하는 현실개조론을 제시하는 교육철학적 입장이 수반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인간의 삶 역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함을 알 수 있다. ● 한시(漢詩)는 본질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서나 정감(性情)을 읊조린 것이며, 사물에 접해서 감흥되고 고양된 정감을 표현한 형식을 뜻한다. 시(詩)는 뜻을 말하는 것이며, 노래(歌)는 말을 읊조리는 것이다. “시는 뜻이 가는 바인데, 마음에 있어서는 뜻이 되고 말로 발해지면 시가 된다. 정(情)이 마음에 움직여서 말에서 형상화되는 것이다.”『시경(詩經)』. 또한 당나라 문인 백거이(白居易 772~846)는 “시(詩)란 정(情)을 뿌리로 하고, 말을 싹으로 하며, 소리를 꽃으로 하고, 의미를 열매로 한다.”했으며, 시(詩)라고 하는 것은 뜻이 가는 바이다. 마음에 있으면 뜻(志)이 되고, 말로 하게 되면 시(詩)가 된다. 정(情)은 마음속에서 움직이고, 말(言)로 모양(形) 지워진다. 말로 부족하기 때문에 감탄한다. 감탄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노래를 한다. 노래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손이 춤을 추고 발이 무도하는 것도 알지 못한다. 감정은 소리에서 발하고 소리가 무늬를 이루니 일컬어 음(音)이다.『시서(詩序)』 ○ 다음 시편은 1764년 가을(甲申秋) 홍양호(洪良浩)가 홍주목사(洪州牧使, 충남 홍성)에 임명(除)되고 난 후에 쓴 시이다. 그는 자신의 시작품에 당풍(唐風)을 구현하고자, 격식에 매인 흔적 없이 자신의 정서를 자연스럽게 표출하고자 했다. 그가 처음 연경(燕京)으로 사신을 갔을 때 만났던 대구형(戴衢亨)은 홍양호의 시작품을 보고 “작품이 깨끗하고 산뜻하면서도 힘이 있으며 솜씨가 익숙해 대가의 노련함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바로 홍양호가 그의 시작품에서 추구한 문학성이었다. 4) 시를 해설하다[詩解] ‘?’ ‘支’ 운(韻) / 홍양호(洪良浩 1724~1802) 萬竅各生吹 일만 구멍에서 제각기 바람이 불어대면 人聲最得奇 사람들의 소리가 가장 기이하게 들린다. 樂從虛處出 즐거이 빈 곳을 따라 나왔는데 鳴豈不平爲 새의 울음이 어찌 평화로움이 아니겠는가. 肉裏藏天 몸속에다 천뢰(天?)를 감추고 毫端見化兒 붓끝으로 조물주의 장난을 치는구나. 風騷千古響 풍소(風騷)가 천고(千古)에 울리어도 寥?問憑誰 드넓은 곳 적막하니 누구에게 물어볼꼬. [주1] 천뢰(天?) : 바람 소리나 빗소리와 같이 자연 현상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소리, 대자연의 음향(音響)을 말한다. 장자(莊子) 제물론(齊物論) 첫머리에, 자신의 집착을 떨쳐버린(喪我) 남곽자기(南郭子?)가 궤안에 기대어 앉아 하늘 피리 소리[天?]에 관해 설명하는 내용이 나온다. 인뢰(人?)는 퉁소 같은 것이 그것이요 지뢰(地?)는 바람이 나오는 땅의 모든 구멍이 그것이요 천뢰(天?)는 모든 소리를 각각 나도록 만드는 자연(自然)이라 하였다. [주2] 풍소(風騷) : 시경 국풍(國風)과 이소(離騷)의 합칭어로 시문(詩文)을 뜻한다. 또는 시문(詩文)을 지으며 노는 풍류(風流)이다. 5) 시를 해설하다[詩解] / 홍양호(洪良浩 1724~1802) 사람 마음의 영묘(靈妙)함이 드러나서 소리가 되고 소리가 육체에 안겼다가 천기에 닿으면 드러난다. 정신과 천기가 합쳐져 법칙에 응하여 문장을 이루니 하늘이 목숨을 빌려주어 시인을 만드는 것이다. 그 소리는 곱고 아름답게 울리는데 예를 들어, 여름철 크나큰 우레 소리 같고 가을철 벌레 소리 같다. 혹시라도 뜻밖에 하늘의 뜻이라면 얻을 수 있는 게 없으니 멈추어야한다. 고로 시가 곧 말씀이고 때 맞춰 이름 한 것이다. 사람이 시를 지어 하늘과 더불어 함께 행하는데, 의미가 있지 않으면 참됨에서 벗어나고, 무의미 할 수 없다면 그 정신을 잃을까 두려워할 것이다. 확실하진 않지만 오묘함이 그 사이에 있으니 심오하여 이해하기 어렵고 미묘하다. 말로는 다 전할 수 없고 사표(辭表)의 뜻이 있어 우선 지경에다 형상을 우거하게 하니, 마치 알을 품는 닭과 같고, 껍질을 벗은 매미와 같다. 지혜로움을 풀어헤치게 하며 그 형상을 잊어버리게 하여 이에 이웃과 자연이 정(情)과 만물에 어긋나게 된다. 사람은 하늘이 아닌지라 마음을 비워야 소리가 난다. 달 가운데 빛이 있듯 좋은 옥(玉)엔 빛이 나고 이름난 꽃이 향기를 내뿜는다. 누가 그 스스로 깨우쳐서 누가 그 공(功)을 주관하랴. 나를 위해 왕예(王倪) 어른께 묻노라니.[人心之靈 發而爲聲 聲藏於肉 機觸而生 神與機合 應律成章 天假之風人 其鳴? 譬如雷奮於夏 ?吟於秋 若或命之 不可得而休焉 故詩之爲言 以時而名 人之爲詩 與天偕行 不可有意 則離於眞 不可無意 恐喪其神 若有若無 妙在其間 玄乎微哉 言不能傳 旨在辭表 象寓境先 如伏卵鷄 如?殼蟬 釋智忘形 乃隣自然 情與物膠 人也非天 虛中之 月中之光 良玉有輝 名花生香 孰知其自 孰宰其功 爲我問之無倪之翁] [주] 왕예(王倪) : 『장자 응제왕』 편의 가공의 인물이다. 〈天地〉편에는 ‘齧缺之師曰王倪 王倪之師曰被衣’라 하여 설결(齧缺)의 스승이고 피의(被衣)의 제자로 기록되어 있다. ○ 어느 날 설결(齧缺)이 세상사의 이치에 대해 왕예(王倪)에게 물었다. 왕예는 모른다고 답했다. 또 물었다. 또 모른다고 답했다. 세 번 네 번 거듭 거듭 물어도 모른다고 답했다. 왕예의 대답을 들은 후, 설결은 크게 기뻐했다. 인간이 좀 안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가. 안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가. 올바른 지식이란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니, 스스로 알지 못하는 줄을 안다는 것이 바로 앎이 된다는 것이다. 왕예는 아는 것이 모르는 것이고, 모르는 것이 아는 셈이라는 묘한 슬기로움을 가르쳐 주어 우리 모두를 눈 뜨게 한다. 사람과 모든 생물들은 자기 나름대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은 옳다고 하고 싫어하는 것은 그르다고 한다. 그러나 일체의 주관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보면 그 자체로써 좋기만 한 것도 없고 나쁘기만 한 것도 없다. 결국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나름대로 자연의 고유한 역할 속에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역할 속에서 무한히 다양해질 수 있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 ● 이계(耳溪) 홍양호(洪良浩 1724~1802)는 조선 영조⋅정조 시대 고위관료를 지낸 ‘실학자로서 문명(文名)을 떨친 뛰어난 문장가(文章家)’였다. 그의 현실인식과 실천 가능한 방안의 제시는 실학자로서 실학 전반에 걸친 새로운 모색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사상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북학사상 목민사상 역사지리인식 화폐경제론 등의 실학사상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천 가능한 정책을 구상 제시하였다. 당시 실학자들이 대부분 그러했듯이 그도 민중·민족의식은 물론 봉건적 신분제와 지주제의 모순과 폐단에 대하여, 농민의 입장에서 절실하게 공감하고 있었다. 그의 작품 <유민의 원성(流民怨)>은 떠도는 농민의 실상을 고발한 악부체 오언고시(五言古詩)이고, 겨울 내내 추위에 노출된 채 보초를 서야하는 수자리 군졸의 원망을 표현한 <변방을 지키는 군졸의 원성(戍卒怨)>은 민중에 대한 애민정신을 담아낸 대표적인 칠언고시(七言古詩)이다. 또한 이러한 민중의식에 바탕을 두고 조선의 역사·지리·언어·문화·예술 등의 영역까지 그의 학문은 다양했고 심오했다. 게다가 그가 목민관으로서 권농(勸農)과 진휼(賑恤)에 진력한 업적이나 민의 이용후생(利用厚生)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제시한 것은 그것을 잘 말해준다. 그가 쓴 지방 수령지침서 <목민대방(牧民大方)>는, 1778년(정조 2) 경흥부사로 재임하면서 저술한 것으로, 수령으로 부임하는 사람들을 위한 목민서이다. 그리고 그의 문학론은 자연스런 천기(天機)의 발현으로 집중되었고, 학문과 문장이 뛰어나 많은 저술을 남겼다. ○ 다음 소개하는 <변방을 지키는 군졸의 원성(戍卒怨)>은 1777년 겨울(丁酉冬)에 홍양호가 경흥부사(慶興府使)로 출보(黜補)되었다가 두만강 하류 국경에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는 군졸들의 고통을 진술한 칠언고시(七言古詩)이다. 6) 변방을 지키는 군졸의 원성[戍卒怨] ‘?’ ‘遇’ 운(韻) / 홍양호(洪良浩) 邊城百事非樂土 변방 성엔 많은 일이 일어나는지라 낙토는 아닌데 孰如江邊把守苦 무엇이 두만강변을 지키는 파수의 괴로움만 하리까? 每歲九月氷已合 매년 9월 달부터 얼음이 얼다보니 ?粮列寨江之滸 휴대 식량은 성채 강가에 늘어놓고 刈薪汲水手自炊 섶을 베고 물을 길어 손수 밥불을 때는데 ?粥那能充腸 죽으로 어찌 창자를 채울 수가 있으랴. 晝夜瞭望不得休 밤낮 아득히 바라보는 보초는 쉴 새도 없으니 敢避虐雪與冷雨 감히 잔인한 눈과 차가운 비를 어찌 피하랴. 皮衣風撲凍欲裂 가죽옷에 바람이 쳐대니 얼어 찢어지려하고 足?口箝向誰訴 발은 트고 입은 앙다물어 있으니 누굴 향해 하소연하랴 獵騎飛來如飄風 사냥 말 내달아서 회오리바람처럼 지나가면 登時火急報官府 말에 올라 화급하게 관아에 보고해야 한다네. 巡點將校不時來 근무를 점검하려는 장교가 불시에 들이닥쳐 ?步暫離逢瞋怒 반걸음 정도라도 잠시 벗어나 있어도 진노하고 隔水往往猛虎 강 건너에는 이따금 맹수 범이 웅크리고 앉아 電視雷吼?可怖 눈을 번쩍이며 우레같이 울어대니 아, 두렵도다. 日日苦待氷解時 날마다 얼음이 녹을 때까지 애타게 기다리지만 三春已暮寒猶 봄의 석 달이 이미 저무는데도 추위는 오히려 가시질 않네 莫云五日許踐更 닷새면 천경(踐更 교대)해 준다는 말이나 하지마소 一番經過病已痼 한 번 수자리 겪고 보면 병환이 이미 고질병이 되다보니 嗚呼 安得拓地盡瑟海 아! 어찌 슬해(瑟海) 밖까지 모두 땅을 개척해 豆江一帶罷防戍 두만강 일대의 수자리를 없앨 수 있으려나. [주1] 미죽(?粥) : 죽이나 미음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주2] 천경(踐更) : 한대(漢代) 경부(更賦)의 한 가지. 병졸로 징집된 자가 금품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보내던 일을 말한다. 또는 부역을 대신하는 사람에게 금전을 주는 제도 [주3] 슬해(瑟海) : 엄숙하고 곱디고운 호수(바다). 우리나라 함경북도와 러시아 국경 부근의 동해를 가리킨다. 『숙종실록(肅宗實錄)』 41년(1715) 7월 1일 조에 “이른바 슬해는 경흥부(慶興府)에서 동쪽으로 사오십 리쯤 떨어져 있는 바닷가라고 한다. 들이 넓고 땅이 비옥하여 옛날에는 번호(藩胡)가 많이 살았는데, 어떤 때는 육로(陸路)를 따라 강을 건너 침범해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배를 타고 바닷길을 경유해 와서 서수라(西水羅), 조산(造山) 등의 진보(鎭堡)를 약탈했으므로, 번번이 그 피해를 받았습니다.”라는 말이 나온다. ○ 위 시는 두만강 하류 변방에서 수자리 사는 군졸들의 고통을, 군졸 자신이 진술하는 방식으로, 군졸의 고달픔을 통해 진취적 기상을 담아낸 것이다. 두만강변 초소에서 경계를 서는 것은, 특히 강물이 얼어붙는 음력 9월부터 늦봄(음력3월)까지이다. 악천후 속에서 경계 근무를 하는 어려움이 여러 체험을 한 경우를 통하여 제시하고 있다. “사냥 말 내달아서 회오리바람처럼 지나가면”은 건너편의 오랑캐가 우리 땅을 침범한 것이며 “닷새면 천경(踐更 교대)해 준다는 말이나 하지마소”라고 한 대목은 5일 단위로 근무교대를 시키는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소연한다. 수자리를 선 군졸들은 몸이 골병들어 고질병이 되었다 하면서 그네들은 수자리 고역으로부터 면제될 날을 간절히 손꼽는다. 시의 마무리 대목에서 “어찌 슬해(瑟海) 밖까지 개척해 두만강 일대의 수자리를 피할 수 있을까”하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내놓는다. 시인 자신이 두만강 건너의 땅이 예로부터 우리민족의 옛 땅이라는 인식에서 이런 시상이 나온 것이다. 민족의식이 한 군졸의 입을 통해 표출된 것으로, 애국적이고 진취적인 감정을 일으키게 만든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내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