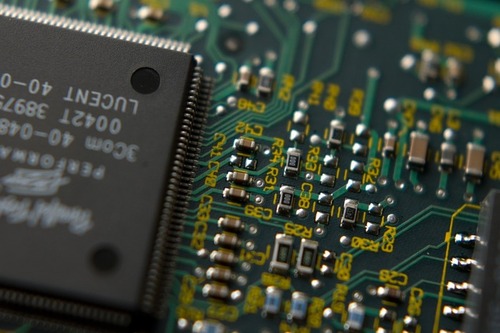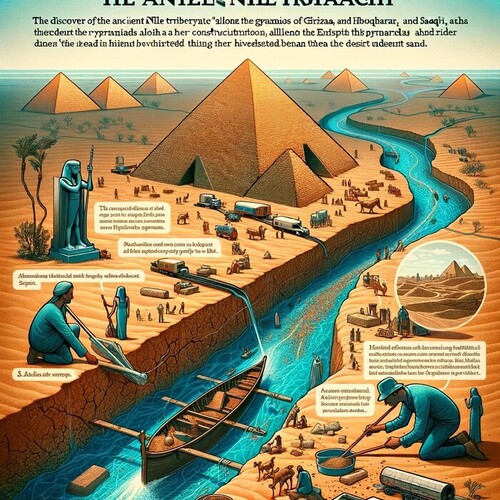무욕청정(無慾淸淨) 유유자적(悠悠自適) ‘은둔(隱遁)’의 여러 부류(部類)
고려 말에 절의를 지킨 세 학자, 삼은(三隱)이 있었다. 목은(牧隱) 이색(李穡),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 야은(冶隱) 길재(吉再)
무욕청정(無慾淸淨) 유유자적(悠悠自適) ‘은둔(隱遁)’의 여러 부류(部類)고려 말에 절의를 지킨 세 학자, 삼은(三隱)이 있었다. 목은(牧隱) 이색(李穡),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 야은(冶隱) 길재(吉再)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 ‘은거(隱居) 또는 은둔(隱遁)’을 생각해 본다. 왜냐고 인간은 오랜 옛날부터 집단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며,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왔다. 그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주하게 된 영혼의 상처는, 때론 치유가 불가능할 만한 흔적을 남기기도 한다. 그래서 누구나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자, ‘시끄러운 세상을 벗어나 조용히 유유자적하며 살기’를 바라는 ‘은둔(隱遁)’을 마음 한 켠에 그려보게 되었다. 그래서 그런지 동서양을 불문하고 화려한 영광을 뒤로하고, 전원으로 돌아가서 일생을 보낸 인물 또한 참으로 많다. 그러나 반면에 선사(禪師)들에게 은둔이란 단순히 세상을 피해 산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깨달음을 얻는 것보다도 어렵다는, 사람 속으로 들어가 어우러지는 '세상에서 가장 먼 만행(萬行)'이었다. 한편 주의할 점은 외출을 전혀 하지 않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죽치고 있는 ‘칩거(蟄居)’와는 그 차원이 다르다. 참고로 누가 뭐라 해도 역사에 기록된 ‘가장 비루하게 완전히 숨어사는 은둔’을 ‘비돈(否豚)’이라 칭했다. 극에 달한 은둔이다. 1) <선사[禪師]> 박세당(朴世堂 1629~1703) 禪師今日下山去 선사가 오늘 산을 내려가니 寺裏何時見上來 언제쯤 절로 올라오려는지 村酒三杯兩脚 막걸리 석 잔에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前溪氷雪滑春苔 얼음 낀 시내에 봄 이끼가 미끄럽네 
○ 은둔(隱遁) 또는 은일(隱逸)에는 먼저 ‘진은(眞隱)’과 ‘가은(假隱)’ 두 부류(部類)로 나뉜다. 전자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무욕청정(無慾淸淨)의 상태로 돌아가 자연 속에 완전히 숨는 것이다. 그러나 후자는 전원에 돌아가 일시 세속적인 활동을 멈추고는 있으나 새로운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니, 아직 세속적 가치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조선조의 선비들은 대개 가은의 부류에 속한다.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의 자세인가는 단정 지어 말하기 어렵지만, 무욕청정의 삶에 가치를 부여한다면 가장 수준 높은 삶의 반열에 '진은'을 내세울 만도 하다. 이러한 진은(眞隱) 중에는 ‘산은(散隱)’이 진정한 은둔(隱遁)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속세를 등지고 죽을 때까지 소식도 없이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던 정희량(鄭希良 1469~?)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 밖의 은둔에는, 관리 생활을 하면서 은거한다는 ‘이은(吏隱)’이 있고, 시중에 숨어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세상 속에 살면서도 속세의 일로부터 단절된 생활을 하는 사람을 이르는 ‘시은(市隱)’이 있다.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요즘 우리나라는, 이 시은(市隱)이 가장 큰 대세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吏隱,市隱) 은둔을 일컬어 ‘대은(大隱)’이라 정의하였다. 그런데 정희량(鄭希良 1469~?)의 「산은설(散隱說)」에서 최고의 은둔으로는, 정한 처소가 없는 ‘산은(散隱)’이라 주장했다. 「산은설(散隱說)」은 장자가 말한 ‘산목(散木)’에서 뜻을 취하여 허위에 가득 찬 혼돈의 세상을 거부하고 스스로의 종적을 감추려는 산은(散隱)의 세계를 추구한 글로써, 그의 시와 함께 저자의 의식세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2) <벽운[碧雲] 푸른 구름> 고려(高麗) 태고보우(太古普愚 1301~1382) 世間誰似碧雲閑 세상에 누가 푸른 구름처럼 한가하랴. 長與淸虛對月寒 늘 맑은 허공 속에 서늘한 달과 마주하네. 四海爲家無一事 사해가 내 집인데도 아무 일 없고 平生行止大無端 평생토록 가고 멈춤이 조금도 걸림 없네. 위는 산은(散隱)을 표현한 대표적인 한시(漢詩)이다. 푸른 하늘에 뜬 구름을 한가로이 그렸다가, 달밤에 떠가는 무심(無心)한 구름을 형상화했다. 온 대지가 내 침대이고 온 하늘이 내 이불인 것을,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으랴. 온 세상 어디를 간들 마음이 자유로우니 거칠 것이 없다네. 이 시는 사람들이 고뇌와 집착을 떠나서, 평온하게 살기를 권장하는 교화의 깊은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특별한 표현 기교를 부리지 않으면서도 소박함, 한가로움, 그리고 여유를 느낄 수 있게 하는 아름다운 시다. ○ 또한 세상일에 관여하지 않고 숨어사는 은거(隱居)에 또 다른 부류가 있다. 속세를 아예 벗어나 은거하는 것을 소은(小隱)이라고 한다. 작은 의미의 은거라는 것이다. 소은은 다시 종사하는 일이나 은거하는 곳에 따라 어은(漁隱), 임은(林隱), 야은(冶隱)이라고도 한다. 시끄러운 도시나 분쟁이 많은 조정 속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은자의 여유를 누리는 은거는 ‘대은(大隱)’이라고 한다. 대은은 이은(吏隱), 시은(市隱)이라고도 부른다. 당나라 시인 백거이(白居易 772~846)는 「중은(中隱)」이라는 시에서, “제대로 된 은자는 조정과 저자에 있고 은자입네 하는 이들 산야로 들어가지만, 산야는 고요하나 쓸쓸하기 짝이 없고 조정과 저자는 너무나 소란스럽다”라면서 한가로운 벼슬(閑職)을 맡아 추위와 주림을 면할 수 있고 여유롭게 지낼 수 있는 ‘중은(中隱)’이야말로, 막힌 것과 터진 것 넉넉함과 모자람 그 네 가지 사이에서 살게 되니 최고의 삶이라고 노래했다. ○ 그러나 옛사람들은 대은을 소은보다 더 높이 쳤다. 그만큼 실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은, 대은, 시은으로 유명한 분으로는 한(漢)나라 무제(武帝) 때의 동방삭(東方朔)과 진(晉)나라의 시인인 도연명(陶淵明 365~427)이 있었다. 세상의 일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의 변화에 몸을 맡긴 채 전원에서 한가로이 생을 보냈던 도잠(陶潛 365~427)의 풍모가 오늘 따라 새삼 그리워진다. “돌아왔노라! 전원이 황폐해질진대 어찌 돌아가지 않으리.” 도연명(陶淵明)의 〈귀거래사(歸去來辭)〉 맨 마지막에 “자연의 변화 따라 죽을 때 되면 가면 그뿐, 주어진 천명 즐기면 되지 다시 무엇을 의심하랴.[聊乘化以歸盡 樂夫天命復奚疑]”라는 말이 생각난다. 3) 도연명(陶淵明)은 도시에서 은거한 ‘시은(市隱)’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음주(飮酒)」라는 시에서 그는 시끄러운 속세에서도 여유로움을 노래했다. 結廬在人境 사람들 사는 곳에 집을 지었지만 而無車馬喧 거마의 시끄러운 소리 들리지 않네 問君何能爾 그대에게 묻노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心遠地自偏 마음이 멀어지면 지역은 절로 외지는 것이라오 사람은 어디에 거주하든지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다스리지 못하면, 속세의 이해에 초연하지 못하게 되고, 반면에 속세에 초연한 사람은 수레 소리 시끄러운 번화가에 살더라도 산골짜기에 숨어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사람들은 도시에서 탈출하기만 하면 곧 안식처가 펼쳐질 것처럼 여기겠지만, 마음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곳도 결국 도시와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 위와 똑 같은 맥락이지만 소은(小隱), 중은(中隱), 대은(大隱)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자. 유능한 인재가 산림에 은거하면 소은(小隱), 혼잡한 시정 속에서 담담하게 살아가면 중은(中隱), 관직에 있되 세파에 휘둘리지 않고 여유로운 삶을 누리는 것, 그걸 대은(大隱)이라 했다. 도가(道家)에서 말하는 ‘진정한 은자의 모습은 대은의 삶’이었다. 백거이는 관직에 있으면서도 ‘속세로 나온 듯 초야에 묻힌 듯, 바쁜 듯 한가한 듯 살겠노라’ 천명하면서 그것을 중은이라 명명했다. 대은이란 게 원래 도가사상(道家思想)의 산물이니, ‘중용되면 벼슬을 하되 그렇지 않으면 자기 수양에 힘쓴다.’는 유가적 관료 입장에서는 차마 대놓고 대은을 표방하지는 못했으리라. 흔히 시중에서 하는 말로, ‘소은은 산야에 숨고, 중은은 저자에 숨으며, 대은은 조정에 숨는다(小隱隱于野 中隱隱于市 大隱隱于朝)’고 했다. 4) <은둔하는 벗의 거처[友人壁]> 양경우(梁慶遇 1568~?) 矮?覆地草生除 낮은 처마 땅을 덮고 뜰엔 무성한 풀 城市誰知有隱居 읍내 사람들 은자의 거처를 뉘가 알랴 一榻午眠人不喚 평상에 낮잠 자니 부르는 사람 없고 晩風吹展讀殘書 저녁 바람 불면 해진 책 펼쳐 읽는다네 ○ 우리나라는 옛날 고려 말에 절의를 지킨 세 학자, 삼은(三隱)이 있었다. 목은(牧隱) 이색(李穡),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 야은(冶隱) 길재(吉再)를 일컫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근년에는 길재 대신 도은(陶隱) 이숭인(李崇仁)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그리고 이 당시 이성계가 역성혁명을 일으키자, 고려의 유신 72명이 새 왕조를 섬기기를 거부하고 경기도 개풍군에 있는 두문동에 깊숙이 들어가 죽도록 나오지를 않았다 한 데서 생긴 고사가 ‘두문불출(杜門不出)’이다. 그리고 유배(귀양살이)가 끝나고, 해배 복권 되었지만, 세상에 다시 나아가지 않고 초야에서 일생을 마치는 경우도 많았다(정서, 홍언충, 유기창 등). 또한 중국의 강서성(江西省) 구강시(九江市) 남쪽 ‘여산(廬山)’은 광산(匡山)·광려(匡廬)라고도 불리는데, 전설에 따르면 주(周)나라 때 광씨(匡氏) 7형제가 이곳에서 오두막을 짓고 은거한 데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덧붙여 <임하필기(林下筆記)>에, 은일(隱逸)로서 정승이 된 사람들로는 정인홍(鄭仁弘), 송시열(宋時烈), 허목(許穆), 박세채(朴世采), 윤증(尹拯), 권상하(權尙夏)가 있었다고 전한다. 5) <은거하다[幽居]> 김수항(金壽恒 1629~1689) 幽居??閉門時 숨어 사느라 쓸쓸히 문 닫은 때 啼鳥催人睡覺遲 새가 울어 늦잠 깨라 재촉하네 晩起小堂無一事 늦게 일어나도 작은 집에 일 없으니 隔窓寒雨獨題詩 창 너머 찬비에 홀로 시 짓는다오 ○ 위 한시(幽居)의 저자 김수항(金壽恒)은 절의로 이름 높던 김상헌의 손자로 가학(家學)을 계승했으며 김장생(金長生)의 문인인 송시열·송준길(宋浚吉)과 종유하였다. 특히 송시열이 가장 아끼던 제자로, 육조의 판서를 두루 거쳤고 좌의정 영의정을 역임한, 한 때 노론계 사림의 종주로 추대되었던 인물이었다. 집권파 남인의 미움을 받아 영암에 유배되고 1678년(숙종 4) 철원으로 이배되었다가 복권했는데, 이후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재집권하자 다시 진도로 유배, 위리안치 되었다가 사사되었다. 바쁜 현대인들은 하는 일도 없으면서 모두가 부산하기 짝이 없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왠지 불안한지 연신 휴대폰을 들여다본다. 거기다가 너나 할 것 없이 정신이 사납다. 고요히 자신과 더불어 자연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봄이 좋을 듯 한데도, 운동부족과 스트레스에 몸이 불어도 바쁜 일상에 운동은 사치인 것 같다. 거기다가 남보다 뒤쳐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매일이 긴장의 연속이다. 열심히 살아도 불안한 미래, 결코 축복이라 할 수 없는 백세시대, 내 마음의 나침판은 방향을 잃은 지 오래이다. 이에 몸과 마음을 가만히 내려놓고 차분히 가라앉히는 것이 먼저이다. 한가함은 산 속에 있지 않고 내 마음 속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 기사 좋아요 1
<저작권자 ⓒ 내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무욕청정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